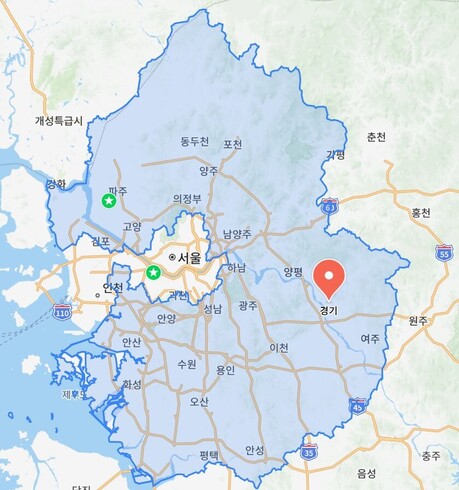5월 2차 자문위 걸쳐 7월 최종 결과 발표 예정
한강 오염, 기후변화 설 난무, 2006년부터 출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대강 사업이후 수생태계에서 나타난 것은 기존에 없던 생물들이다. 바로 큰빚이끼벌레가 강마다 출현했다.
한강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끈벌레(Lineus alborostratus)다.
한강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한강 하류에서 끈벌레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06년부터라고 했다. 당시만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는 어류 등을 황폐화 시킬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끈벌레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때는 2013년부터 어민들이 밤새 쳐놓은 그물마다 끈벌레가 다수의 죽은 실뱀장어와 섞인 채로 발견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어민들 주장에 따라 끈벌레가 많이 나온 곳은 행주대교에서 한강 상류쪽으로 6~7㎞ 지점에 있다. 이곳은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생센터가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지점이다.
어민들은 이런 현상에 대래 "두 곳의 물재생센터에서 오래 전부터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나 분뇨를 한강으로 방류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해 끈벌레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
|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가 제공한 끈벌레 |
한강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 심화식 위원장은 "한강 물을 한 바가지 뜨면 53%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라며 "이들 두 곳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내보내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미 5년 전에도 행주대교 북단 빗물펌프장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하천이 역류하는데 이때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함께 보내, 한강에서 수만여 톤이 내보내기를 반복했다. 이렇다보니, 자유로를 달리는 차량운전자들이 악취에 시달리기 일쑤다.
강 생태계 전문가들은 "오염된 방류수로 신곡 수중보가 막혀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돌연변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끈벌레가 나오는 곳은 한강 여의도 유람선이 정박된 물 속다. 수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9월까지 한강 하류뿐 아니라 상류에서도 나타는데 어민들 주장대로라면 실뱀장어가 살수 없다는 것은 다른 민물고기 치어들도 살수 없다는 얘기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가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강 고양시 구간 끈벌레 발생 원인을 규명위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 한창 진행중이다. 이번 용역 목적은 한강 수질과 끈벌레류 발생원인 규명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 영향조사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서식되고 있는 끈벌레류 주 조사지역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행주대교 남단 구간이며 수질오염 조사는 가양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을 직접범위로, 서울시계~김포시 시계~파주시계를 간접범위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식지, 이동경로, 증가원인 등 끈벌레류 생태 규명 방안 ▲독성조사 ▲어획량, 폐사율 등 실뱀장어 조업실태 및 피해조사 ▲실뱀장어 폐사 규명 및 폐사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 ▲한강 서울시 오염원으로 인한 한강 수질오염 영향조사 ▲한강 수질오염이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조사 ▲어민 피해규모 등이다.
현재까지 연구용역은 87%를 마친 상태로 5월 2차 자문위원회를 거쳐 7월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