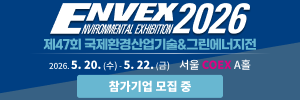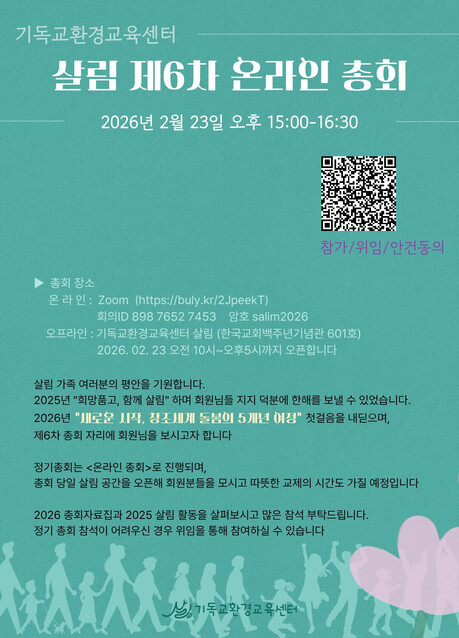선창가 풍성해야 할 국민 대표 생선 되찾기 모두 노력
천하제일일미 조기 맛, 옛 향수만큼 우리 수산물 지켜야
 |
[환경데일리 온라인팀]어릴 적 할머니께서 마당을 가로 질러 늘어진 빨랫줄에 말려 놓은 살이 통통한 조기,어머니께서는 이를 입맛이 없던 가족들을 위해 찜통에 쪄서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발라서 밥숟가락에 올려주시던 그 조기.
바닷바람에 빨래줄은 흔들흔들, 잘 말라서 인지, 그 맛은 천하제일일미였다.
우리나라 대표 생선 중 하나, 모두가 좋아하는 '조기'다. 조선시대는 삼삼하게 간한 조기를 왕과 신하들도 즐겨 먹었다.
지금으로 부터 약 300년 전 이야기다. 서해 5도 연평도에서 임경엽 장군이 청나라를 치기 위해 중국으로 향할 때 식량이 부족해 황해도 연평도에 들렀는데, 이 때 엄나무 가지로 발을 만들어 바다를 막았더니 조기가 하얗게 걸려들었다고 한다.
수없이 잡힌 조기를 뱃군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소금에 절여 배에 실은 후 무사히 중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연평도에 전해지고 있다. 이후 임경엽 장군을 '조기잡이 신'으로 황해도 어민들의 추앙을 받았다.
실제로 임 장군을 모시는 사당인 연평도의 충민사(忠愍祠)에서는 매년 봄 조기잡이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임원십육지'에 따르면, 소금간을 했다가 꾸덕꾸덕하게 말린 건조식품이 국민 누구나 다 좋아했으며, 바닷고기 중에 맛이 으뜸이다.
봄햇살이 좋아지면 해류를 타고 올라오는 생선이라고 해 유수어(踰水魚)라고도 한다. 조기를 즐겨먹는 이들은 원기라 허할 날이 없을 만큼 조기(助氣)라고 불렀다. 옛 문헌에는 발음은 같지만 조기(朝紀), 조기(曹機)라고도 했다. 조기는 명절상차림과 잔칫상, 제사상 등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귀한 생선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기의 성질은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가 불러 오르면서 갑자기 이질이 생긴 데 주로 쓰는데, 조깃살로 만든 죽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영양식으로도 많이 애용됐다. 조기는 구워 먹어도 좋고 국이나 찌개도 좋다.
조기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말렸다가 구워 먹는 것이 제맛인 조기는 말리며 '굴비'라고 불린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 따르면, 조기떼를 만난 어부들이 어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산더미처럼 너무 많이 잡혀 배에 다 실을 수 없었다.'고 기록된 것이 조기의 현실이다.
해양생태계 변화,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인해 조기에 대한 귀한 생선이 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선창가에 사람들이 붐비고, 어선과 외지인들이 많이 몰릴 그런 항구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사람에게 기를 돋군다는 조기(助氣)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참조기, 백조기, 수조기, 부세조기로 구분되는데 쉽게 구분되는 3종류를 올려보았다.
참조기와 백조기는 말려놓으면 구분을 못하는데 백조기는 회색빛이나며 아가미 옆에 검은반점으로 구분한다.
수조기는 비늘에 검은점들이 사선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수 있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조기와 부세다. 조기와 부세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입이 둥글고 꼬리가 붓처럼 가지런하고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없는것이 부세이다.
조기는 입이 굴곡이지고 꼬리가 갈라져있고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이 조기라고하는데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 사진처럼 옆선이 한줄로 그어져 있는것이 부세이고 바지 지퍼처럼 두줄로 겹쳐있는 것이 조기라 구별하심이 좋을 듯 하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